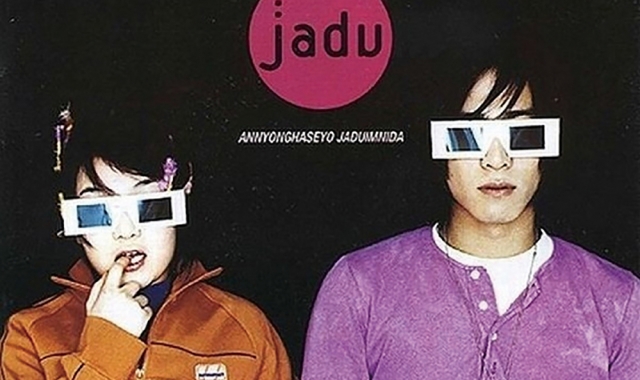2015년 4월, <장수상회> 이후 8년 만이다. 강제규 감독의 짧지 않은 공백을 깬 작품이 이제 막 나라를 되찾은 마라토너들의 이야기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고 걷고 뛰는 동작이 관객에게 전달하는 힘이 대단하다고 줄곧 생각해왔다. 언젠가 이 신체적 아름다움을 영화로 담고 싶었다.” 2018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는 휴 허드슨 감독의 <불의 전차>를 떠올렸다. 인간의 육신이 지닌 본질적인 아름다움, 인물들의 목표를 한계짓는 시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견지하기 위해 그는 길거리 모퉁이와 러너들의 숨 쉬는 방식까지 당시의 것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1947 보스톤>을 통해 계속 달려야 할 의미를 구현한 강제규 감독을 만났다.

- 2018년에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이후 각색 작업을 하면서 어떤 점을 신경 썼나.
기본적인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 당시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시대극을 잘 보지 않는다’는 우려가 컸다. 젊은 관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딱딱한 부분들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분위기 전환을 도와주는 게 바로 남승룡 역의 배성우 배우다. 코믹한 포인트를 살려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극의 균형을 잘 맞춰준다.
- 떠오르는 마라토너 유망주인 서윤복 역할로 임시완 배우를 낙점했다. 임시완으로부터 서윤복을 느낀 지점은 무엇인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다 보니 그 인물들과의 현실적인 일치율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야만 관객이 쉽게 몰입할 수 있고, 주인공에게 동화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요 소재가 마라톤이라는 스포츠 종목이어서 신체 비율이나 근육 구조, 얼굴 분위기 등을 신경 썼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한 결과 임시완 배우가 가장 가까워 보였다. 실제로 서윤복은 그 당시에 선비 같고 성미가 대쪽 같았던 걸로 유명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임시완 배우와 비슷해 보였다.
- 배우들이 마라톤을 준비하며 훈련받는 과정은 어땠나.
우선 임시완 배우는 섭외를 마치자마자 육상구락부 선수들과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운동의 강도나 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을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지도받으면서 훈련을 했다. 서윤복 선수는 당시에도 마라토너로서 드문, 가장 최적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유망주였기 때문에 그런 특징과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임시완 배우가 체중을 감량하며 고생을 많이 했다. 반면 배성우 배우는 체중 감량을 크게 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1947년의 36살 마라토너다. 연륜과 나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끔 신체적 조건을 맞추려 했다. 하루는 현역 마라토너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영화 속 선수들의 자세나 호흡법이 잘 재현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말 그랬다. 디테일한 부분을 고증하기 위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 마라톤이라는 종목 특성상 달리는 그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소 심심할 수 있는 장면에 어떤 고민을 담았나.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격렬한 전쟁이나 액션을 많이 다루었던 터라 이번 촬영은 좀 쉬울 거라 생각했다. 나의 오만이었다. 어느 날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독님, 마라톤 영화 하신다면서요? 아유, 그거 힘들어요” 하더라. (웃음) 일단 마라톤 특성상 리테이크가 어렵고, 뜨거운 태양 아래 배우들이 탈수나 탈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힘들다. 제한된 시간 안에 촬영을 마쳐야 해서 가급적이면 한번에 오케이할 수 있도록 초긴장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체력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단조롭고 루스하게 보일 수 있는 마라톤 과정을 관객이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도록 연출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래서 구간별로 잘라 그 사이사이에 스토리를 넣었다. 한국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관객 또한 이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레이스를 달리는 느낌으로 북돋워주려고 했다. 마라톤을 입체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 영화 촬영을 마치고 3년 만의 개봉이다. 촬영 당시와 달리 편집과 연출의 고민도 달라졌을 것 같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 관객은 계속해서 극장을 찾지만 뭐랄까, 장벽이 높아진 듯한 느낌이다. 옛날에는 쉽게 봤던 영화들도 이제는 ‘그 정도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 같다. 점점 허들이 높아지면서 스스로도 계속 재점검을 했다. 관객이 환호하는 영화의 기준에 내 작품이 부합하는지, 혹은 관객과 간극이 생기지는 않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번의 블라인드 시사회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 중 블라인드 시사회를 가장 많이 가졌다. 그런데 좋은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보게 되더라. (웃음)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품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 ‘애국’이라는 키워드를 일종의 신파 코드로 읽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했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 각색부터 촬영하는 내내 팀원들에게 과잉된 감정으로 감동을 강요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이미 뼈대가 역사적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위적인 슬픔을 추가하면 너무 넘쳐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가져가되 감정을 첨삭하지도 너무 절제시키지도 않았다. <1947 보스톤>은 목적이 뚜렷한 작품이라 관객과 일정한 거리를 둬도 역사적 연대와 감정적 연결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