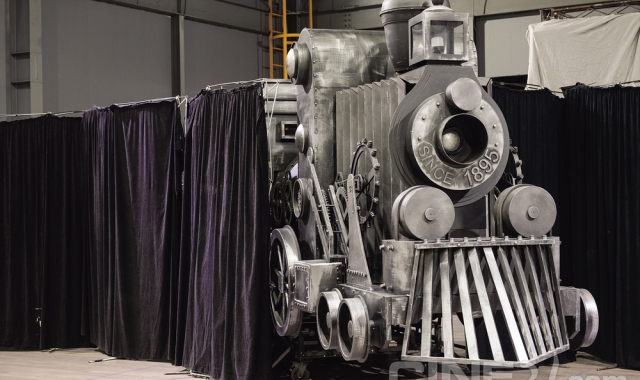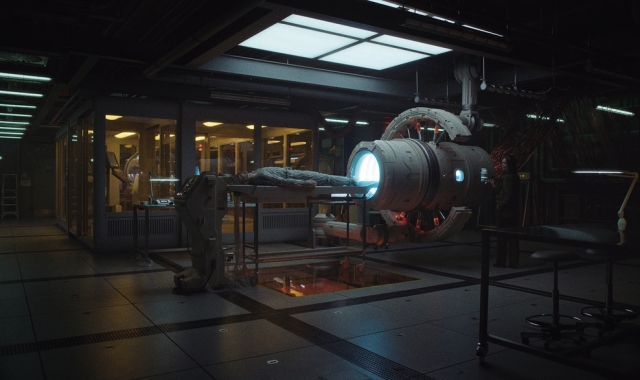촬영전투, 기쁨과 절망의 좌충우돌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단편영화는 미래의 영화”라는 앙드레 바쟁의 유명한 전언은 단편 영화의 서글픈 운명을 암시한다. 미래를 꿈꾸는 자가 현실의 궁핍함을 견뎌야하듯, 단편영화 작가는 현재의 한기(寒氣)를 참아내야 한다. 그래서 단편영화 작가들은 언제나 목이 마르다. 군소 단편영화제가 많아지고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편영화의 존재감은 전보다 훨씬 두터워졌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기획에서 유통까지, 단편영화에 짐지워진 숙제는 속시원히 풀린 게 없다. 관객과의 만남이 빈번해지고 인디스토리나 미로비전 같은 배급사의 노력으로 해외영화제 나들이가 잦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급시스템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영화만들기는 온전히 작가들의 몫이다. 아직까지는 단편영화 작가가 지원을 요청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게, 아쉽지만 우리의 현실이다.그런 풍토에서 이스트만코닥 단편영화 지원제도는 거의 파격에 가깝다. 이스트만은 35mm필름 1만자를 제공하고, 제반 후반작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천2백∼3백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스트만 제도의 미덕은 그 규모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제작지원 방식에서 ‘이스트만 시스템’의 장점을 찾아야 한다. 코닥필름주식회사가 주관하지만 이스트만 제도에 무게를 실어주는 건 각종 영화기관들의 협찬이다. 곧 카메라 대여에서 현상, 편집, 사운드 믹싱, 텔레시네까지 관련 회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고 있다. 3회에 이르는 동안 이스트만에 뜻을 함께하는 회사가 늘어난 것은 이 제도의 안정성을 보증하며, 동시에 ‘또다른’ 이스트만 제도의 가능성을 암시한다.<우아하게…>와 <터틀넥 스웨터>는 98년, <장롱>은 99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이스트만 당선작은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상영이 약속돼 있다.
‘미래의 영화’감독들에게 35mm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행운이다. 이는 단순히 35mm 영화가 16mm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필름의 크기가 영화의 질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이즈가 문제인 것은 35mm필름으로 또다른 형식실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1회 공모 당선작인 김진한 감독의 <장롱>은 이같은 35mm필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영화로 꼽을 만하다. <장롱>은 공간의 짜임새가 도드라지는 영화다. <장롱>은 벽을 경계로 집안의 공간을 나눠 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하거나, 길을 가는 아버지와 길 위 육교를 걷는 딸을 부감으로 동시에 잡는 등 넓은 화면을 최대한 사용한다. 사운드 또한 영화의 주요 모티브로 작용하는 괘종 시계소리를 선연하게 들려준다. <장롱>은 이사를 가면서 말뚝처럼 박혀 있는 할머니의 장롱을 버리고 가야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그려낸다. 또다른 1회 당선작은 이형주의 <우아하게 걸어라>와 육상효의 <터틀넥 스웨터>. <우아하게…>는 아내 대신 가사일을 도맡은 남편의 자질구레한 일상을 묘사해 관성처럼 받아들여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터틀넥 스웨터>는 오랜만의 재회에서 한 남자와 그의 옛 애인을 통해 관계의 가벼움과 소통의 불가능함을 묘파하는 영화다.

‘유명인사들’이 섞여 있던 1회에 비해 제2회 이스트만 공모에서는 신예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염정석의 <광대버섯>은 흑백화면의 고절한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죽어가는 여동생의 고통을 덜어줄 모르핀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줄타기에 나서는 광대오빠의 서글픔보다는, 줄 위에 주렁주렁 달린 백열등이 물 위에 드리운 빛그림자가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민동현의 <지우개 따먹기>는 아이들의 사소한 장난에서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지우개 따먹기 싸움에서 늘 이기고도 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소년의 이야기를, 경찰에 쫓기는 운동권 학생인 소년의 누나와 대비시킨다. 이동하의 <블랙 컷>은 영화에 끼어드는 블랙 컷을 징검다리 삼아 물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건너간다. 감독의 자전적 체험과 고민이 물씬 배어나는 흑백 영화다. 세편 중 <광대버섯> <지우개 따먹기>는 99년 부산국제영화제 출항 전에 완성돼 부산에서 관객과 첫만남을 가졌고, <블랙 컷>은 최종 후반작업이 한창이다.
이렇듯 세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단편영화를 길러내는 일은 우리 영화 토양을 기름지게 한다. 그렇다면, 단편영화 제작지원의 길은 더 넓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