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를 껴안은 지하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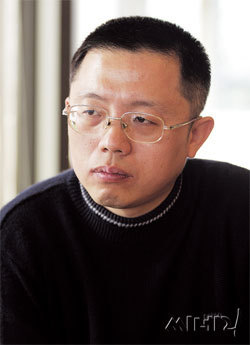
2002년 11월에 부산영화제를 찾았던 왕차오는 <씨네21> 데일리에 지아장커의 롱테이크와 롱숏이 자기만의 형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남겼다. 그 다음달 <씨네21>에 실린 지아장커의 인터뷰에는 왕차오의 미학적 성취가 현실과의 관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실려 있다. 근소한 시차를 두고 우연히 한마디씩 남겨진 그 비판의 왕래가 흥미롭지 않았다면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유릭와이의 <명일천애>를 이 자리에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거장의 열에 오른 지아장커의 영화파트너(유릭와이는 <소무> <플랫폼> <임소요> 등의 촬영기사였다)에 대한 소개는 솔직히 덜 신선하다. 지하전영 내부에서 다양한 대립적 비판의 각을 세울 수 있는 독불장군 하나가 나왔다는 것이 더 생생하다. 왕차오는 충분히 그런 논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감독이다.
왕차오는 영화감독 이전에 이미 영화평론가였다. 시인이었고 4편의 작품을 쓴 소설가였다. 또, 1991년 베이징영화학교에 입학한 이른바 6세대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나이 스물일곱,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형이었다. 첸카이거의 영화 <풍월>과 <시황제의 암살>에서는 조감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년간 극빈 생활을 해온 노동자였다. 데뷔작 <안양의 고아>는 자신의 그런 힘든 시절의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공장 노동자 ‘다강’, 몸을 팔아 근근이 연명하다 아이까지 낳게 된 창녀 ‘양리’. 한때 이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살며 삶의 불빛을 찾을 듯하는 순간이 오지만, 운명은 다시 깊은 수렁으로 발목을 잡아끈다. 다강은 (아마도) 살인죄로 감옥에 가고, 양리는 단속에 쫓기던 중 아이를 잃은 채 경찰차에 실려간다. 영화는 그리고 끝난다. 삶이 그렇게 피폐하므로 감정의 표출은 없다. 넘치는 침묵이 인물들 사이를 채운다. 그들은 대체로 말을 할 힘이 없다. 영화 속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말고는 음악조차 없다. 그렇다고 그걸 대체할 만한 풍성한 이미지가 영화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화면은 의도적으로 메말라 있다. 몇번의 패닝을 제외하곤 카메라는 시종일관 고정되어 있다. 그것도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인 롱숏으로만 이루어진다. 혹은 끈질긴 침묵의 시간을 긴 롱테이크로 잡아낸다. 왕차오는 본질적인 몇개의 반복 숏만으로 영화가 구성될 수 있다는 고집이 있다(본인은 그것을 브레송에게서 배웠다고 말한다). 최소의 시선으로 영화의 리얼리즘이 가능하다는 믿음도 있다. 때문에 깊은 시야 심도를 이용해 인물들의 미장센을 만들어내거나 지속시간을 재면서 그들의 감정을 기다린다. 길 한쪽 귀퉁이에서 건너편을 비추는 카메라,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과 자동차와 마차들은 화면을 가로질러가면서 영화를 영화가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인물들은 때때로 실제 인파에 묻혀 실종되었다가 다시 나타난다. 그 롱숏과 롱테이크가 극한의 형식까지 가도록 왕차오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가 다른 지하전영 감독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5세대의 은유적 또는 알레고리적 미학이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던 위험성은 지나친 형식주의였고 현실을 잡아먹는 치장이었다. 지하전영 세대들은 이미 발각된 그 모순을 돌파하기 위해 세상과의 거친 관계를 호흡하면서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한다. 미학의 덫에 잡히지 않기 위해, 완전히 그것과 결별하기 위해, 도리어 카메라를 세우고 또는 흔들어대는 것이다. 때문에 지아장커가 보기에 왕차오는 형식주의의 그런 위험 수위를 내포하고 있다. 그가 무척이나 위험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영화를 시작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왕차오는 형식의 소우주 없이는 현실과의 관계도 없다고 판단한다. 말하자면, 왕차오는 제5세대의 형식적 강박을 은연중에 외면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안양의 고아>는 미학적으로 오히려 동세대의 지하전영 감독들보다는 첸카이거의 <황토지>에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5세대가 실패했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이상 중국적인 것을 모사하는 방식에 있지 않고, 중국의 현실 그 자체를 포착하는 방식에 있다. 내몽골의 어느 탄광을 배경으로 한 그의 다음 영화 <낮과 밤>은 산업사회의 이행기 안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시골 청년과 그의 전 주인과 그 아내 사이에 얽힌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왕차오에 대한 질문과 기대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