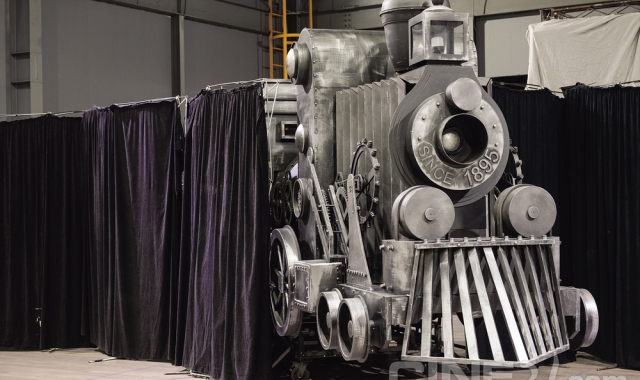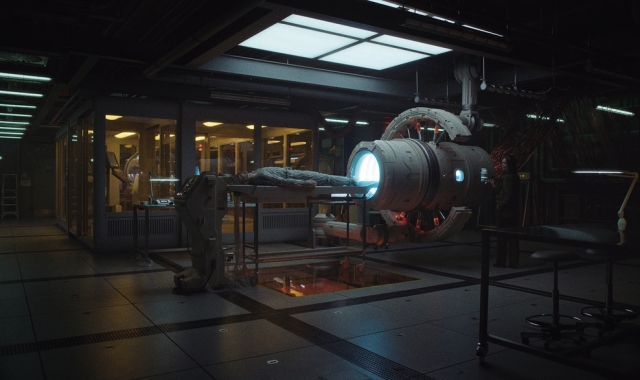김기덕 감독의 신작 <시간>이 드디어 8월24일 개봉한다. 그동안 개봉 여부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극장에서 만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기덕 감독은 이 영화가 한국의 극장에서 개봉될 마지막 영화일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더불어, 이 영화가 “20만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흥행실적이나 배급규모로 볼 때 상황이 좋지는 않다. 과연 우리는 김기덕 영화를 다시는 한국의 극장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인가? 황진미, 한창호, 변성찬, 남다은 네명의 평론가가 영화평을 보내왔다. 응원이든 비판이든 <시간>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기는 흔치않은 영화다. 4인4색 영화평을 통해 <시간>이 던지는 철학적, 영화적 질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죽음만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고백하자면, 나는 김기덕의 영화를 진심으로 좋아해본 적이 없다. 한때는 그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 방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뒤에는 그동안 그의 영화를 미워했던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내가 그의 세계를 진정 이해하고 있는지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빈 집>을 보았다. 그해 본 영화들 중 가장 아름다운 상상력을 지닌 작품이었다고 기억한다. 그가 만들어낸 몸의 언어는 실로 놀라웠다. 그러나 <활>을 보고 난 뒤, 김기덕은 내 앞에 다시 벽을 만들었다. 솔직히, <활>은 좀 비겁하게 느껴졌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간>을 두번 보았다. 최근 본 한국영화 중에서 이만큼 마음을 울린 영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기덕의 영화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그 순간의 감동을 담은 지극히 주관적인 글이다. 그리고 그의 선언처럼, 다시는 그의 영화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이다. 나는 그에게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다.
잉여와 무(無) 사이의 그 가까운 거리
영화의 처음과 끝은 동일한 장면이다. 그러나 과연 동일할까?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쓴 여인(성현아)이 액자를 들고 서 있다. 급하게 지나가던 세희가 그녀와 부딪치는 순간 액자가 깨진다. 세희는 깨진 액자를 다시 끼우겠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없이 사라진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도입부다. 도입부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거의 정확하게 반복된다. 이상한 차림새의 여인이 액자를 들고 서 있고, 세희와 닮은 여자(혹은 세희)가 지나가다 부딪친다. 액자는 깨지고 여인은 사라진다. 이 마지막 부분은 플래시백으로 제시된, 말하자면, 파국적인 영화의 끝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에필로그가 아니다. 그것은 처음과 동일한 모습을 한, 그러나 처음과 결코 같을 수 없는 또 다른 시작의 순간이다. <시간> 속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그것은 파괴적인 욕망으로 피 흘리는 시간, 끊임없이 지워지고 비워지는 실패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장면의 반복을 순결했던 초반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김기덕은 결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육체에 새기면서도 다시 그 자리에 도착하고 만 자의 운명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무섭고 처연하다. 관계와 시공간과 상황이 반복될수록 새로움에 대한 불가능한 열망은 커지고 인물들은 프랑켄슈타인이 되어간다. 반복은 아무것도 복원시키지 못한다. 시간이 덧붙여질수록 사랑은 실패한다. 얼굴이 덧붙여질수록 존재는 상실한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회복하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버리고 잃는다. 잉여와 무(無) 사이의 그 가까운 거리. 오직 죽음만 남을 때까지 계속될 반복, 끊임없는 돌아감. 세희는 성형수술로 새희가 되었고 새희는 가면을 쓰고 세희를 반복한다. 그러나 더이상 진짜를 간직하지 않는 그 기괴한 반복에 의해 육체는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신을 지시하지 않는다. 세희(새희)는 새희(세희)가 아니고 지우는 지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 혹은 어딘가로 돌아가기 위해 인물들이 또다시 생살을 찢어낼 때, 보는 이의 마음에서도 피가 난다. 김기덕은 영화의 마지막에 세희도, 새희도, 지우도, 사랑도, 기억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말하고 또 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무것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영화의 끝에서 우리가 보는 건 바닷가에 반쯤 잠긴 텅 빈 손가락, 그저 텅 빈 시간뿐이다.
무섭고 처연한 텅 빈 시간을 노래하다
<시간>은 김기덕의 열세 번째 영화다. 그의 열두 번째 영화 <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활>은 단관 개봉했고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김기덕은 한국에서 자신의 열세 번째 영화를 개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영화의 개봉을 앞둔 지금, 그는 이제 자신의 열네 번째 영화를 한국에서 개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다짐한다. <시간>은 부재와 결핍이 아니라 이미지와 감정의 과잉을 통해서 처절한 시간의 철학을 우리의 눈앞에 불쑥 던져놓는다. 마치 그가 <활>의 비참한 결과를 대면한 뒤, 침묵하며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라는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창조해낸 것처럼. 그러니 그의 선언이 구원을 요청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든, 협박이든, 응석이든 상관없다. 그의 바람대로 20만명의 관객이 <시간>을 찾아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