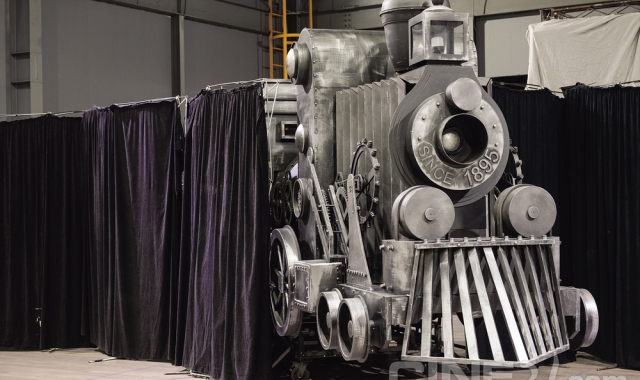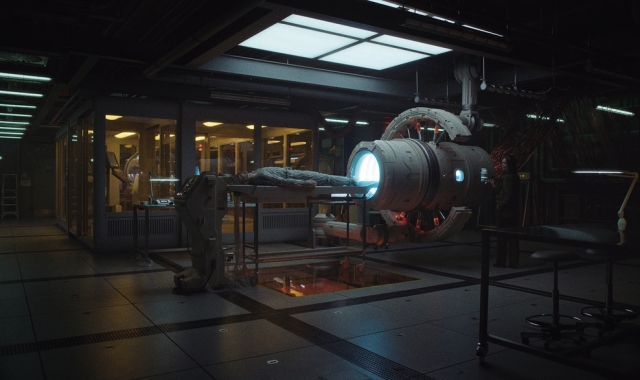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시간>을 다 본 첫 느낌은, 한마디로, ‘뜨악했다’. 말 그대로 <시간>은 ‘선뜻 끌리지 않는’ 또는 ‘미덥지 못한’ 김기덕의 영화였다. 다시 말하자면, <시간>은 매우 ‘낯선’ 김기덕의 영화였다. <시간>의 영화적 공간은, 그동안 익숙해져버린 전형적인 ‘김기덕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 공간은 <악어>의 ‘다리 밑’과 같은 도시 주변부적 삶의 치열한 생존의 공간도, <수취인불명>의 기지촌과 같은 역사적 공간도, <섬>의 ‘저수지’와 같은 상징화된 우화적 공간도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 대사가 많은 ‘수다’스러운 영화였다. <시간>의 공간은, 전형적인 홍상수적 공간에 가까워 보였다. 그 공간과 김기덕의 ‘유치한 대사’와의 만남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어색해 보였다.
새로운 공간에서도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이제까지 이 글을 과거 시제로 써왔다. 아직 <시간>을 한번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특히 김기덕 영화는 두번 이상 보아야 말을 걸어온다. 김기덕은 독특하고 특이한 ‘취향’(아비투스 hatitus)을 지니고 있는 감독이다. 그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취향의 정치학’에 대한 질문과 사유를 자극하고 촉발한다. 김기덕의 영화언어는 늘 ‘생경’(生硬)스럽게 다가온다. 그의 언어가 기의와 기표 사이에 미학적인(또는 자의식적인)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 ‘즉물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에는 늘 순진하고 우스워 보이는 상투성(특히 ‘대사’)과 그만이 감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독창성이 공존한다. 김기덕 영화는 ‘영화적 관습’에 대한 자의식의 매개없이 세상(상식, 관습, 제도)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그 ‘생경함의 미학’은 때로 불편하고 우스꽝스럽지만, 바로 그만큼 아름답고 힘이 있다. 그 아름다움과 힘은, 그의 영화가 ‘언어(대사)’를 잃고 ‘침묵’할 때, 그만큼 강력해진다. 그래서 나(보다 정확하게는 나의 ‘취향’)는 그의 ‘침묵의 영화’들이 덜 불편했고, 그만큼 재미있었다. 그가 성취해가는 ‘침묵’을 통한 ‘발화’의 방법이 반가웠다. 그가 왜 다시 ‘대사의 영화’로 회귀하는지(또는 해야만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은 김기덕 영화였다는 것, 그런 만큼 상식의 저편에서 웅성대고 있는 ‘거대한 침묵’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침묵의 발화’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아야 한다. 가능한 한 대사를 듣지 말고, 자막을 지우고서 말이다. 결국 이 글은 <시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왜 아직 ‘평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지나치게 길어진 변명인 셈이다. 또는 김기덕의 영화 <시간>을 다시 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의 명세서이다.
3자의 관계를 어떻게 포착하고 드러낼까
첫 번째 질문.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시간>은 김기덕의 새로운 ‘영화적 공간’에로의 진입 시도를 보여준다. 그 공간이 새롭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공간은 정확히 ‘소시민적 일상성의 공간’이며,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홍상수적 공간에 가까워 보인다. 그 시도는 김기덕의 오랜 영화적 욕망이었던 ‘보편성에의 지향’의 징후로 보인다. 김기덕은 자신의 영화가 협소한 ‘계층-계급성의 코드’로 독해되는 것에 저항해왔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영화적 공간을 찾고 또 시도해왔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에서 김기덕은, <빈 집>에서 ‘유령’이 되어 우화적 공간의 형식으로 우회하여 반걸음 진입했던 그 도시적 공간의 일상성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새로운 공간 또는 시도 속에서 자신 안의 ‘거대한 침묵’을 드러낼 표현 방식을 찾아내고 있는가(또는 있을 것인가)이다.
두 번째 질문. 영화 <시간>이 던지는 ‘화두’는 일견 ‘시간’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기덕은 ‘사랑’에 대한 세상의 ‘상식’을 새삼스러이 끌어안고 질문을 던진다. “… 그러나 오랜 만남으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설렘이 식었고, 몸이 식었고, 열정이 식었고, 그리움이 식었다….” 그의 시나리오 전문(前文)의 한 토막이자 영화 속 인물을 통해 반복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세상의 ‘상식’이다. 그런데 <시간>은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다’라는 긍정문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가득하다. 김기덕의 이 ‘어른-아이’다운 질문 방식. 이것이 <시간>을 ‘신체성’과 ‘시간’이라는 화두로 이끌어가는 동력이기도 하다. <시간>이 3자의 관계를 어떻게 포착하고 드러내는가(성공 또는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은, 그의 ‘과거’의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서도, 또 ‘미래’의 영화를 예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