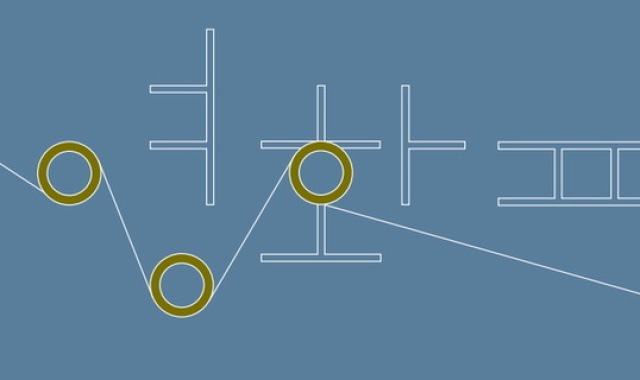1995년 4월 동시에 태어난 <키노>와 <씨네21>은 서로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엄마 친구 딸’이었다. 숱한 편집회의의 결론을 되살려 “우리는 주간지이기에 갈 길이 다르다”고 소심하게 말해봤자 사람들은 건성으로 끄덕일 뿐이었다. 당연했다. 영화 주간지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었으니까. 이른바 ‘다른 길’이 뭔지 <씨네21> 초대 편집장이 독자에게 설명할 방도는 매주 한권씩 쌓이는 <씨네21>뿐이었다. 어차피 맨땅에 헤딩할 바에야 백지가 낫다는 판단이었을까? 조선희 편집장은 대담하게도 연예잡지 경력이 전무한 평론가, 신문기자, 1년차 프리랜서로 창간팀을 구성했다. (내 기억에) 그녀가 시야에서 놓치지 않은 푯대는 “저널리즘의 규율과 시선으로 영화에 접근한다”는 원칙이었다. 여기엔 영화를 가십거리로 다루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와 더불어 가판에서 신문을 사보는 보편적 독자와 눈을 맞춘다는 위치 설정이 포함된다. 1년에 극장 한번 가는 50대에게도 무리없이 읽히되 20대 영화광도 솔깃한 정보가 있는 잡지. 믿을 만한 전문가 견해를 유통시키고 무엇보다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가 한국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접속하는지 매주 중계하는 언론. 이 청사진 아래 실무과정에서 기자들이 가장 자주 접한 표어는 “스타는 진지하게, 감독과 스탭은 섹시하게 써라”였다.
스스로 엄격히 훈련된 기자였던 조선희 편집장은 치밀한 데스크였지만 서툰 글보다 지루한 글에 더 질색했다. 샘쟁이여서 기자는 물론 외부 필자도 잠재력을 못 발휘한다 싶으면- 혹은 다른 지면에 더 잘 쓰면- “내 참 신경질 나서…”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논쟁에 눈을 빛냈고, 옳다고 확신하면 검열철폐 등 캠페인에도 잡지의 몸을 사리지 않았다. 시나리오, 평론 공모 등 이벤트에도 적극적이었다. 덕분에 기자들은 앓는 소리를 내며 커갔다. 함께 일한 시간을 통틀어 항상 고독하게 과로했던 조선희 편집장은, 실망시키기 너무나도 두려운 선배였다. 그리고 짐작건대 그녀가 제일 겁낸 건 독자의 실망이었다. <씨네21>은 그렇게 조기폐간을 면했다.
그들 각자의 잡지관(觀)
후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특집과 고정 코너를 뽑았다

고정 코너 / 소설가 구보씨의 영화구경
그야말로 느긋한 산책
<씨네21>의 오랜 고정 지면이었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정훈이 만화’의 전신인 만화 vs 영화 등의 코너가 바로 이 시절 탄생했다. 특히 90년대를 풍미했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의 작가 주인석이 연재했던 칼럼 ‘소설가 구보씨의 영화구경’이 인기였다. 경제 얘기로 시작해 정치인 욕도 좀 하다가 비로소 영화 얘기를 시작해 ‘매혹적이기는한데 그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런 수고를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영화인들이 결코 던지지 않을 질문도 슬쩍 던지는 그의 칼럼은 느긋한 산책을 닮았었다.

특집 / 충무로 파워50
순위 정하는 영화주간지?
모두가 어렵겠다고만 했다. 오죽하면 <씨네21> 창간팀을 이끌었던 조선희 편집장의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유럽에도 전례가 없다던 영상‘주간지’ <씨네21>은 그렇게 관심과 회의 속에서 탄생했다. 세간의 걱정을 잠재우려면 뭔가 ‘센’ 기획이 필요했으리라. 당시 대중문화계의 ‘빅뱅’이었던 영화산업의 지형도를 정리해보자는 의미에서 조선희 편집장이 기획한 ‘충무로 파워50’은 영화계의 큰 화제가 됐다. 창간 멤버였던 사진팀의 오계옥 기자에 따르면 “순위에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영화인”도 있었다고.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무로 파워50’은 <씨네21>의 연간 특집으로서 한국 영화계의 흐름을 충실히 기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