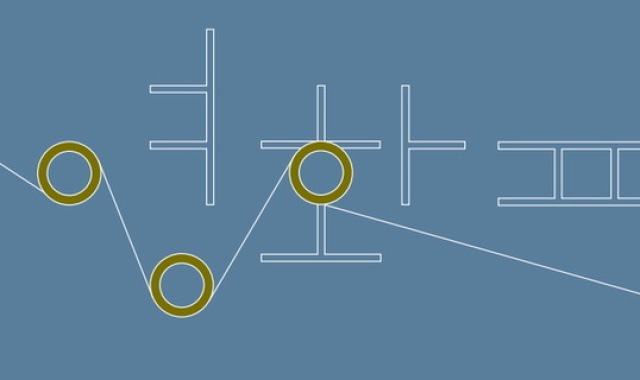가끔은 아직도 나를 편집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난다. 대개는 지금의 나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씨네21>에서 일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쩐지 친근감이 들기 때문이다. 전에 한번도 만난 적 없는데도 알고 지냈던 사이 같은 느낌. 그건 <씨네21>을 누군가는 읽고 기억해준다는 반가움이기도 하다.
<씨네21>을 떠난 지도 4년이 넘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뭐든 후회가 따르지만 편집장을 그만두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다. 하나는 기자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고 다른 하나는 후배들에게 더 많이 칭찬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다. ‘야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야구감독의 인터뷰를 읽고 무릎을 친 적이 있다. 리더는 결코 부하들을 불쌍하게 여기면 안되고 그들의 한계를 규정해선 안된다는 말 때문이다. <씨네21>을 만들면서 이건 영화 주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지레 겁을 먹었던 적이 많았고 기자들이 쓸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재단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한주 안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했던 일들. 마음이 약해 독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기획들. 이러니 내가 좋은 리더가 못됐구나 싶어 후임 편집장에겐 늘 이렇게 조언을 했다. “애들을 강하게 굴려라. 그래야 책도 살고 애들도 큰다.” 물론 듣는 이의 표정은 좋지 않다. 안다. ‘야신’은 야구계에도 1명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채찍질이라면 기자에게 당근은 칭찬이다. 칭찬은 채찍보다 수십배 효과적이라 나도 기자 시절 잘 썼다는 한마디를 들으면 한주의 피로가 말끔히 씻기곤 했다. 편집장은 누구보다 먼저 기사를 읽고 칭찬할 수 있는 특권적 자리다. 그러다 보니 기사를 넘긴 기자들은 편집장의 반응을 예의 주시한다. 아무 반응 없이 기사가 넘어가서 디자인이 되면 그걸로 맡은 바 일을 다한 셈이 되지만 여기 편집장의 한마디 칭찬이 더해지면 절로 흥이 난다. 가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언제 어떤 칭찬을 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는 후배들이 있다. “내~가?” 하며 기억을 못하는 티를 내고 말지만 나 역시 그랬다. 조선희, 안정숙, 허문영 등 전 편집장들이 해준 칭찬을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막상 편집장을 하는 동안 칭찬에 인색했다는 후회를 한다. 칭찬은 남발해도 효과가 반감하지만 너무 인색하면 최초의 독자로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편집장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후배들에게 칭찬 많이 못해준 거, 살갑지 못한 성격 탓이 컸다고 뒤늦은 변명을 해본다.
<씨네21> 창간 18주년이란다. 독자 여러분이 채찍질도, 칭찬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편집장 시절 내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그게 꼭 편집장의 독려나 칭찬일 필요는 없다. 책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독자 반응에 목마르다. <무비위크>도 사라지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영화 주간지라는데 오래 곁에 있기를 소망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여전히 매주 <씨네21>을 읽으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맛난 밥을 먹을 때나 벚꽃이 핀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종류의 만족감이다. <씨네21>이 아니면 이제 어디서 영화에 대한 진지하고 재미있는 글을 한데 모아 볼 수 있겠나. 직장으로는 <씨네21>을 떠났지만 나는 지금도 <씨네21> 편이다. <씨네21>이 있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