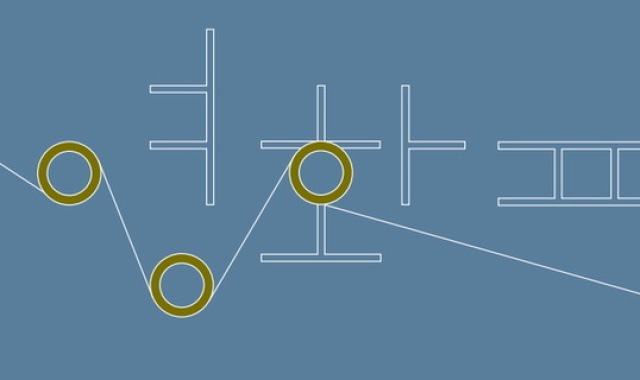2000년 봄, 창간편집장 조선희가 떠난 자리에 내가 왔을 때, <씨네21>은 이미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로 한국영화와 독자들 속에 예민해서 더욱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양적, 질적으로 급팽창하던 한국영화의 힘과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새로운 세대의 영화열은 <씨네21> 생장의 필요조건이었다.
영화‘시장’이 확대되면 독자 역시 증가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화잡지들이 연이어 새로 등장했다. 한데 200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 사이에 등장한 잡지들은 왜 월간지가 아니라 주간지였을까. 나는 <씨네21>에 머물던 이태 동안 세 종류의 영상 주간지 창간호를 읽었다. 혼자 서 있던 지경 안에 경쟁자가 들어서는 데 우리가 초연했다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긴장하니까 좋은 점도 있었다. 우리는 광각 또는 깊은 초점, 때로는 길고, 때로는 경쾌한 호흡, 앵글 등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탐냈다. 크게 보아 영화를 중심에 두되 곳곳에 사회와 문화를 향한 문과 창을 내 영화가 좋아 모여든 독자들이 이곳에서 세상과 호흡하도록 한 창간 때부터의 잡지 구조는 유지했다. 지금까지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공간구성법이다.
그때도 한국영화는 ‘건설 중’이었다.
<친구>의 성공, 특히 상업적 성공으로 시작된 2001년의 풍경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한국영화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대거 진입하기 시작했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할리우드를 대체할 듯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건설은 계속될 것이며, 자본의 힘은 점점 막강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건설’의 그늘도 명확해졌다. 지금은 기억도 멀어졌지만 ‘와라나고’ 재상영운동이 일어난 것도 2001년 말의 일이다. <와 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의 네편의 수작이 관객과 접점을 미처 확보하기 전에 상영관을 잃자, 관객이 그 재상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나는 2001년에 이 잡지에 고별의 말로 쓴 편집장의 글(이듬해에도 상습적으로 마지막 글을 썼는데)에서도 ‘와라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해,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로 돌아오고, 홍상수 감독은 <오! 수정>을, 김기덕 감독은 <수취인불명>을, 김지운 감독은 <반칙왕>을 발표하고, 이창동 감독은 <오아시스>를, 임권택 감독은 <취화선>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영화 네편을 덮던 그늘은 점차 한국영화판에 번져갈 참이었다.
우리가, <씨네21>이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한권의 잡지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한국영화 관객폭발의 시대 한복판에서 내가 담당한 시대는 우연찮게도 2000년대의 첫 두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대사를 내게 배당한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영화들이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상력의 크기가 축소되는 것이다.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를 상업적인 이유로 제한한다면 그건 민주적 대화법이 아니다. 영화의 국적과 상관없이.” (물론, 한권의 잡지가 ‘영화다양성’ 진작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덧붙이는 말. “<씨네21>만 남았다.” 인터넷에서 기사의 이런 제목이 내 시선을 훔쳤다. 2001년 창간된 영화 주간지가 폐간됨으로써 영화 주간지는 하나만 남았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사라진 잡지의 목소리들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