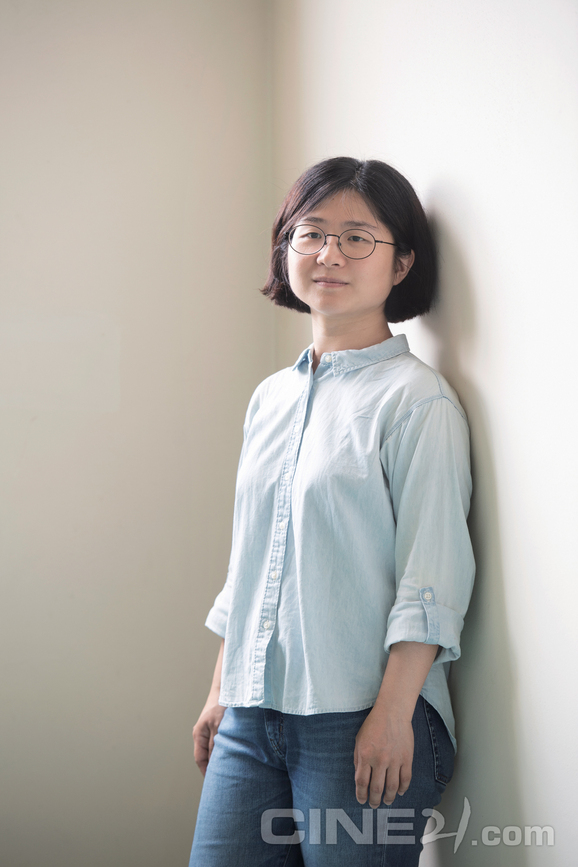
유은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 <밤의 문이 열린다>는 BIFAN의 국제경쟁부문인 ‘부천 초이스: 장편’의 유일한 한국영화다. 또한 경쟁부문에 선정된 한국 장편 중 유일한 여성감독의 영화다. 한국 장르영화에 있어 여성 감독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호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장르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유은정 감독을 만나니 괜스레 든든하다. <밤의 문이 열린다>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혼수상태에 빠진 혜정이 유령이 되어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통과하는 이야기다.
-유령이 되어 과거를 돌아보는 여자의 이야기다.
=돌이킬 수 없거나 지나간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유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전부터 만들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영감을 받은 전시도 있는데, 2015년 여름에 김희천 작가의 비디오 작품 <바벨>을 봤다. “요즘은 죽지 않으려고만 하지 살아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바벨> 속 대사가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도 벅찬데, 제대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혜정 캐릭터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구석이 있다.
=또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이나 집을 산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성공을 꿈꾸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최소한으로 방어를 하며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내게도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주변이 불안정하더라도 나만 안정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과연 옳은 건가 싶다.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혜정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들이 있나.
=우선 구로사와 기요시의 <회로>(2001)를 보면서 유령들 또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 필사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악마의 등뼈>(2001),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스토커>(1979)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주요 캐릭터가 모두 여성이다.
=단편영화를 만들던 시절부터 호러영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시나리오 리뷰를 받으면 내가 만든 남자 캐릭터들이 가상의 인물 같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웃음)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내 관심사고 내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다.
-단편 <낮과 밤>(2012), <싫어>(2015) 등에서도 도시 청년들의 현실,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해왔고,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예리하게 삐져나온다.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주거 문제는 언제나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다. 새로운 가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직접 경험한 현실이 치명적인 인상들로 남는 것 같다.
-첫 장편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제작 및 투자 지원을 받는 건 내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길었다. 내가 그리고 내 이야기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땐 힘이 들었다. 그래도 영화가 완성되고 상영을 앞둔 지금은 설레고 행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