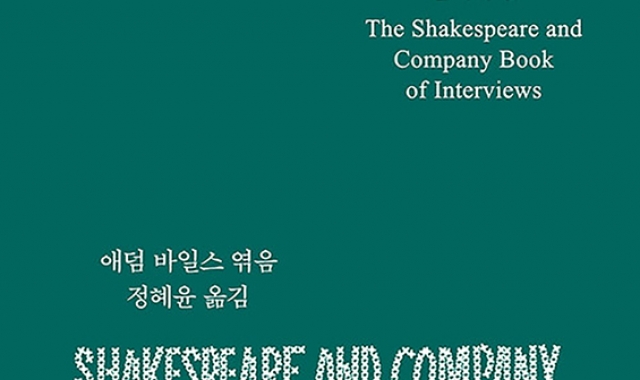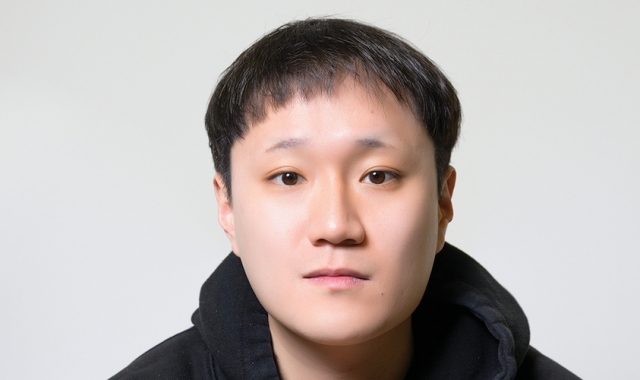익숙한 부스스한 머리칼에 기타 케이스를 멘 그 젊은 무명인은 남몰래 유명인을 꿈꿨을까. 자신의 우상인 포크 음악가 우디 거스리의 병동을 찾아간 무명의 밥 딜런에게서 시작한 카메라는 1965년 중대한 음악적 기로에 선 유명인 밥 딜런의 무대로 향한다. <컴플리트 언노운>은 전기영화임에도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고 전형성에서 비켜난 방식으로 갈등과 긴장의 고조를 그려낸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시대의 슈퍼스타, 티모테 샬라메와의 대화를 전한다.

- 2019년부터 이 역할을 준비해왔다. 긴 여정이었을 텐데.
드디어 이 영화를 내보일 수 있다는 게 후련하다. 오래 묵혀둔 숙제를 끝낸 기분이랄까. 여러 번 촬영이 밀릴 때만 해도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심했던 때가 있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준비만 하다가 사라질 운명인가도 싶었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 밥 딜런은 빛나는 지성과 노래 가사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세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 아닌가. 위대한 예술가와 현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 영광이다. 사실 여전히 그 끝없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기분이다. 밥 딜런을 연기하는 시간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를 알아가고 그의 예술을 탐구하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컴플리트 언노운>의 어떤 면이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
한 예술가가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임스 맨골드 감독도 이 점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했다. 이 영화는 사실에 기반한 전기영화이기도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밥 딜런은 살아 있는 사람이다. 또 나만의 해석을 통해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확정적인 사건을 향한 고정된 시선이 아니라 해석에 방점이 있다는 게 중요했다.
- 밥 딜런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적인 인물인데 역할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나.
농담이 아니라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베일에 싸인 예술가를 연기할 때 좋은 점은 자료가 얼마 없다는 거다. 특히 1961년에서 1963년 사이 딜런에 대한 자료는 그 수가 극히 적다. 당연히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뒤져서 연구했고 D. A. 페네베이커의 <돌아보지 마라>나 마틴 스코세이지의 <노 디렉션 홈: 밥 딜런> 같은 다큐멘터리나 딜런이 직접 쓴 글, 자서전까지 다 찾아봤다. 미네소타, 뉴욕, 시카고 등 밥 딜런이 거쳐간 도시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악이었다. 운 좋게 이 역할을 준비할 시간이 5년이나 주어졌다. 적어도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밥 딜런에 대해서는 샅샅이 뒤졌다고 말할 수 있다.
-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밥 딜런의 말투부터 버릇을 익히는 것까지 역할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준비가 내게 벅찼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덜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막상 촬영이 시작되고 나니 내가 이 남자의 젊은 시절로 걸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다. <돌아보지 마라>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밥 딜런이 마치 나인 것 같았다. 그 장면에서 딜런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무언가를 겪은 것 같은 기분이야”라고. 나 역시 그랬다.
- 재현이나 모방을 넘어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있나.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 그렇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다. 예술가나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에 이상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쏟아부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중에서 일부라도 제대로 맞아떨어졌기를 바랄 뿐이다.
- 촬영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라이브로 노래하겠다고 결정했다던데.
라이브가 더 나을 것 같았다. 내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건 오페라가 아니라 포크 음악이다. 포크의 정수는 불완전함에 있다. LA 스튜디오에서 다듬어진 매끈한 사운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의 균열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촬영장에서는 음악팀과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음악팀은 계획대로 사전 녹음된 음원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라이브는 안된다고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다. 그때 말을 안 들었던 게 결과적으로 옳았다.
- 피트 시거의 집, 우디 거스리의 병실, 작은 라이브 카페와 카네기홀, 음반 녹음실과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악기로 노래를 선보인다.
공간마다 지닌 특색을 살리는 데 충실하려 했다. 영화에 나오는 가스라이트 카페처럼 천장이 낮은 아늑한 공간에서 연주하는 것은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 또 카네기홀은 마이크에서 나오는 에코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컬럼비아 레코드사의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공간마다 사운드의 질감이 전부 다 달랐다. 이 영화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른 것도 좋았지만 다양한 공간에서 곡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 무대에서 관중들의 야유를 받으며 공연하는 장면을 찍을 땐 어떤 기분이었나.
정말 짜릿했다. 그 장면의 매 순간이 그랬다. 사실 1965년에 열린 뉴포트포크페스티벌은 미국 역사에서도, 밥 딜런의 음악적 선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대담하게 자신이 원하는 예술적 방향을 추구한다는 건 용기 있는 일이다. 아마 우리 모두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옳다고 믿는 길을 따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 이 영화에 프로듀서로도 참여했다.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결심한 이유는.
이 영화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싶었다. 사실 이 영화는 세번이나 엎어졌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되살렸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또 내가 워낙 밥 딜런의 팬이다 보니 원래 대본에 없던 곡을 영화에 끼워넣을 수 있었다는 점도 이유라면 이유다. <All Over You>나 <Subterranean Homesick Blues> 외에도 몇곡은 내가 선택해서 영화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