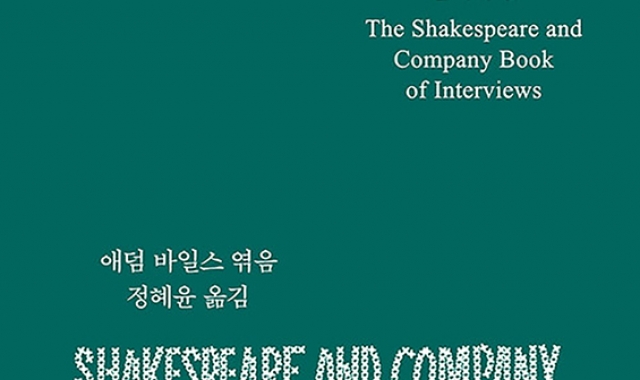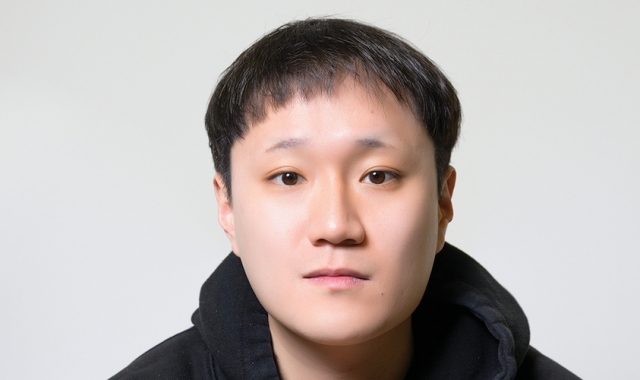밥 딜런이 위대한 뮤지션이어서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다. 원래 그의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스타일과 분위기도 멋지다고 생각했다. 결정적 계기라면 음악 사학자인 엘리아 왈드가 쓴 밥 딜런에 관한 서적을 읽고 나서였다. 1965년 뉴포트포크페스티벌로 향해 가는 영화적 구도가 떠올랐다고나 할까. 내가 작품에 끌린 이유는 두 가지다. 딜런은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인물이다. 또 뉴욕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다. <컴플리트 언노운>은 밥 딜런이 무일푼 떠돌이 신세로 기타 하나만 들고 뉴욕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한다. 나는 이 시작이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한다.
- 영화의 타임프레임을 1961년에서 1965년 사이로 지정했다.
전기영화의 흔한 공식처럼 출생에서 죽음까지 혹은 노벨상이나 오스카상을 받는 순간까지를 다루는 방식은 조금 위험하다. 당시 음악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정치, 도덕,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매체였다. 밥 딜런과 이 영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때 그는 “1961년부터 1965년까지는 사실상 50년대의 연장선이었고, 1965년 이후부터가 진짜 60년대”라고 말했다. 이 시기 포크는 1950년대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핵전쟁의 공포와 냉전, 베트남전, 전세계적인 민권운동 등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격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 연주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많은 밥 딜런 역에 티모테 샬라메를 선택했는데.
가끔 내가 영화감독이 아니었다면 도박꾼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도박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본능적으로 티모테 샬라메가 잘할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현세대에서 뛰어난 배우 중 하나라는 이유도 컸다. 2019년에 첫 촬영에 들어가려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할리우드의 작가·배우조합의 파업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촬영 지연이 티모테에게는 양날의 검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밥 딜런 역을 위해 초콜릿의 나라든, 스파이스의 나라든(티모테 샬라메는 <웡카>와 <듄>의 주연을 맡았다.-편집자), 기타와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니며 5년간 준비해야 했으니까. (웃음)
- 밥 딜런은 신비로운 이미지의 인물이다. 이 영화에서 그의 진실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실로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 그의 예술에는 자연스러운 신비로움이 있다. 밥 딜런이 가사에 담긴 모든 의미를 전부 알려주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미스터리가 적나라하게 설명되길 바라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술은 그런 구체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태어난 다양한 해석과 비유, 은유를 열어두는 데 존재 의미가 있으니까. 밥 딜런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밥이 지어내 대답한 과거사가 창작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 모두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스로를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젊은이였는지 누가 알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