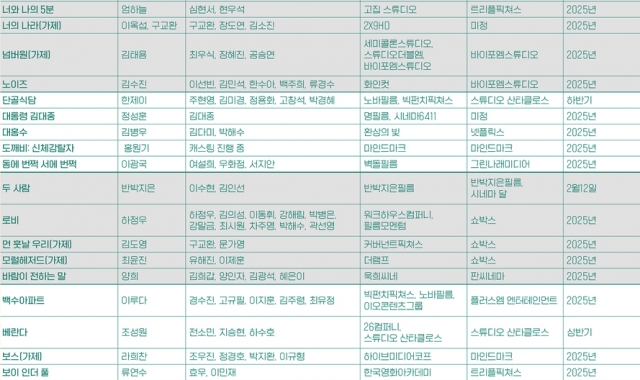<탈주>로 지난해 여름 극장가를 달궜던 이종필 감독이 곧바로 신작 <파반느>를 선보인다. 박민규 작가의 장편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영화화한 이 작품은 왠지 음울한 인상의 백화점 직원 미정(고아성)이 모두에게 주목받는 사람 경록(문상민)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멜로드라마다. 미정과 경록 사이엔 백화점의 유명한 괴짜 요한(변요한)이 끼어들어 오작교를 자처할 예정이다. 이종필 감독의 말마따나 근래 흔치 않은 ‘정통 멜로’로 인사할 <파반느>를 기대해본다.

원래부터 박민규 작가를 좋아했던 터라 2009년에 소설이 나오자마자 읽었었다. 왠지 모르겠는데 꼭 내가 이 책을 쓴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막 20대가 끝나고 30대에 접어들던 때여서 그랬는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는 세밀한 과정에 굉장히 몰입했던 것 같다. 무척 사실적인 사랑의 연대기여서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10대 때부터 멜로영화를 좋아했고 특히 고등학생 땐 <첨밀밀>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은 정통 멜로를 꼭 찍어보고 싶단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원작을 보자마자 영화화의 소망을 품게 됐다.
- 소설의 이야기를 사실적이라고 느낀 이유는.대개 멜로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가진 게 무엇인지 뽐내려는 편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이들이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 어두침침한 백화점 지하에서 만난다 해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등 현실적인 이야기가 내게 여러 화두를 던졌다.
- 원작은 1980년대가 배경이다. 영화는 어떤가.시대물은 아니고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몇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삼았다. 시간적 배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질감은 딱히 들지 않았다. 굳이 인물 주변의 매질들을 모두 현대화해야겠단 생각도 안 했다. 왜냐하면 주인공 세 사람의 취향이랄지 모습이 되게 옛날 사람 같아서다. 클래식이나 옛날 록 음악을 듣고, 오래된 호프집을 다니고, 출퇴근을 해도 시장 뒷골목으로만 간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 주인공 셋의 기본적인 기질은 원작과 비슷한지.조금 건방진 표현인데, 정말 이 소설을 스스로 체화했다고 느낀다. (웃음) 그 두꺼운 책을 필사는 기본이요 인칭을 바꿔서도 써보고 시제를 뒤틀어서도 써봤다. 그러다 보니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는 인칭과 시제라고 느꼈고 그것들을 위주로 미묘하게 바꿔가면서 썼다. 경록의 나이대가 20대 중반으로 원작보단 많아졌는데, 청춘의 한 ‘정체기’에 있다는 점에서 원작과 크게 다르진 않다.
- 소설은 주인공 남자의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데.그 부분이 다르다. 소설의 축은 ‘나’라는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고 상대를 찾는 과정의 교차 진행이다. 액자식 구성도 있고. 반면에 영화는 쭉 간다. 경록의 시점으로 갔다가, 미정의 시점으로 갔다가, 요한의 시점으로도 가면서 인물 위주로 축이 바뀐다.
- 오래전부터 고아성 배우를 미정 역에 점쳐둔 것으로 안다.
원작을 보면서 했던 고민들, 이를테면 예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설 속 묘사를 어떻게 각색할 것인지 등이 고아성 배우와 대화를 하자마자 싹 풀렸다. 고아성 배우가 자신이 “이 인물의 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더라. 미정을 외적으로 어떻게 규명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둡고, 실제로도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나타나는 인물로 그렸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현실이 어려워서 자신을 꾸밀 여유도 딱히 없다. 그럼에도 볼수록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사랑의 ‘자격’ 같은 게 과연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 정통 멜로라고 했지만, 말했듯 지하 주차장이 주요 공간일 만큼 밝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다.
심지어 지하 3층까지 있어서 내려갈수록 더 깜깜하고 주인공들도 그곳에 서식하는 사람들처럼 어두침침하다. (웃음) 멜로영화라고 해서 번쩍거리고 아름다운 공간만 택할 이유는 없다고 느낀다. 오히려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서 마치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 속닥거리는 인물들의 모습이 더욱더 진짜 사랑 같다고 생각했다.
- 영화의 속도감도 궁금하다. 요즘 극장가는 멜로드라마의 고전적인 속도감과 달리 대개 재빠른 템포를 원하는데.
20대의 사랑, 청춘영화가 시간의 감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원작에서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라는 식의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그것처럼 정말 이 영화의 속도감도 흘러갈 때는 굉장히 빨리 흐르고, 멈출 때는 정확히 멈추는 식으로 연출했다.
- 어떤 영화에 빗대어 상상하면 좋을까.<사랑한다면 이들처럼>(1990)처럼 평범한 이들의 사랑 이야기이고, 누군가는 허진호 감독님의 <봄날은 간다>를 떠올리기도 했고, 또 누구는 <비포 선라이즈>를 말하기도 하더라. 한편으론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보들의 행진>이나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작품의 아날로그적인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 물론 예전의 이야기를 계속 전복하는 흐름의 작품이다. 예전 멜로영화들이 감성을 툭, 툭 놓는 느낌이라면 <파반느>는 감성을 흩날리는 식이랄까. 아, 영화에 참여한 분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2000년생인 문상민 배우였는데 얼마 전 편집본을 보고 나서 “되게 세련됐네요”라고 운을 떼더라. (웃음) 진짜냐고 다시 물었더니 “진짜로 엄청 세련된 것 같은데요”라고 말해줬다. 2000년생의 눈에서도 세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다.
<파반느>

<파반느>의 이 장면 “특정한 장면보단, 사랑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어느 시절의 누군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의 집합이라고 말하고 싶다. ‘누구야 잘 지냈니?’, ‘스물몇살 때 너랑 걸었던 어디가 생각난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